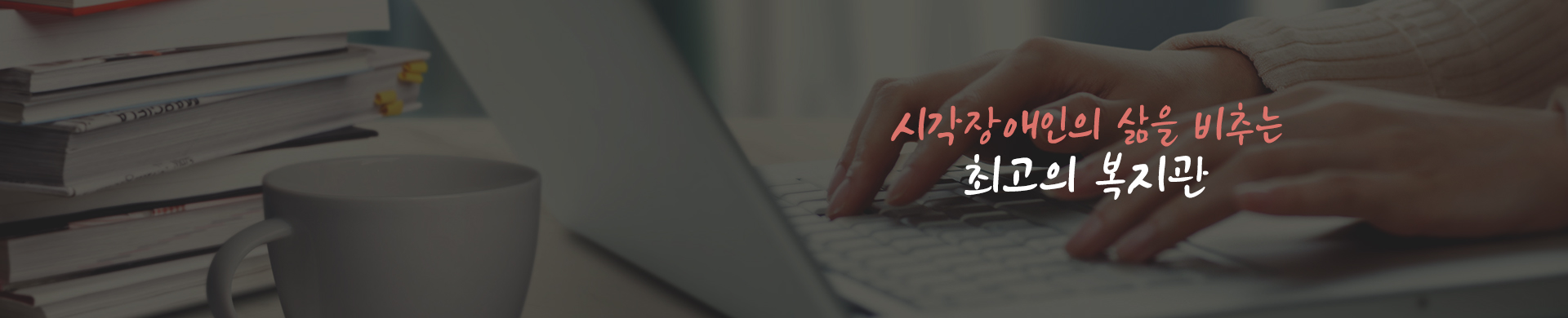시각장애 교사의 비대면 수업… “즐겁게 통화하는 기분”
관리자
기사자료
0
6131
2020.05.21 09:17
시각장애 교사의 비대면 수업… “즐겁게 통화하는 기분”


시각장애 1급 교사인 양회성(60)씨가 13일 서울맹학교 용산캠퍼스 한 교실에서 학생들과 전화통화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최지웅 기자
“출석 불러볼게요. 김OO씨?” “네! 선생님 들어왔어요.”
13일 오전 11시 서울맹학교 용산캠퍼스 2학년 1반 교실. 시각장애 1급 양회성(60) 교사는 왼쪽 맨 앞줄에 있는 책상에 앉아 학생들의 이름을 불렀다. 10명의 학생들이 우렁차게 대답했다. 책상 위에 놓인 양씨의 휴대전화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였다.
시각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안마·침술 교육을 담당하는 양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집단통화(그룹콜)’ 방식의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양씨는 “청각에만 의존하다보니 되레 수업 집중도와 참여도는 비장애인보다 훨씬 높다”고 자부했다. 그는 “1대 1로 학생들과 통화하고 수다떠는 기분”이라며 “시간가는 줄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경기도 안성의 시골마을에서 6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다. 부모님은 가난한 소작농이었다. 그런 양씨에게 불의의 사고가 닥친 건 초등학교 6학년이던 어느 여름날이었다. 축구공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동네 형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 양쪽 눈 안에서 출혈이 있었다. 양씨는 처음에 부모님께 아픈 걸 숨기다 뒤늦게 동네 작은 안과를 찾았다. 하지만 안약 투여와 적외선 치료가 전부였다고 한다. 그는 “시력이 나빠져 글씨를 잘 못 쓰는 것을 보고서야 부모님이 알아채셨다”고 회상했다.

“출석 불러볼게요. 김OO씨?” “네! 선생님 들어왔어요.”
13일 오전 11시 서울맹학교 용산캠퍼스 2학년 1반 교실. 시각장애 1급 양회성(60) 교사는 왼쪽 맨 앞줄에 있는 책상에 앉아 학생들의 이름을 불렀다. 10명의 학생들이 우렁차게 대답했다. 책상 위에 놓인 양씨의 휴대전화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였다.
시각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안마·침술 교육을 담당하는 양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집단통화(그룹콜)’ 방식의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양씨는 “청각에만 의존하다보니 되레 수업 집중도와 참여도는 비장애인보다 훨씬 높다”고 자부했다. 그는 “1대 1로 학생들과 통화하고 수다떠는 기분”이라며 “시간가는 줄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경기도 안성의 시골마을에서 6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다. 부모님은 가난한 소작농이었다. 그런 양씨에게 불의의 사고가 닥친 건 초등학교 6학년이던 어느 여름날이었다. 축구공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동네 형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 양쪽 눈 안에서 출혈이 있었다. 양씨는 처음에 부모님께 아픈 걸 숨기다 뒤늦게 동네 작은 안과를 찾았다. 하지만 안약 투여와 적외선 치료가 전부였다고 한다. 그는 “시력이 나빠져 글씨를 잘 못 쓰는 것을 보고서야 부모님이 알아채셨다”고 회상했다.

시각장애 1급 교사인 양회성(60)씨가 13일 서울맹학교 용산캠퍼스 한 교실에서 학생들과 전화통화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최지웅 기자
양씨에게 ‘희망의 끈’을 내려준 건 라디오였다. 이듬해인 중학교 1학년 겨울에 건강 프로그램에서 안과 의사의 강연을 듣고 간절한 마음에 방송국으로 편지를 보냈다. 여동생에게 대필을 시켜 쓴 편지엔 “제 눈을 고쳐달라”는 호소로 가득했다. 며칠 뒤 연락이 닿은 의사는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의사는 양씨에게 추천서를 써줬다. 서울맹학교에서 안마·침술 교육을 받도록 앞길을 터준 것이다. 부단한 노력 끝에 이후 양씨는 단국대 특수교육학과를 졸업했고 1990년 9월 꿈에 그리던 서울맹학교의 교사로 당당히 돌아왔다.
양씨는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은 장애인만 가르친다. 그의 수업에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이 있다. 양씨는 “후천적 장애인이 선천적 장애인보다 더 괴로워 한다. 현실을 부정하기 때문”이라며 “나도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위로를 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을 일상으로 복귀시키는데 주력한다고 했다. 양씨는 “때때로 학생들과 등산을 하며 꽃을 만지게 한다. 계속 용기내 과거를 회상해야 꽃이 무슨 색인지 잊지 않을 수 있다”며 “혹여 ‘검은 장미꽃’이라고 말하고 다니면 안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양씨에게 ‘희망의 끈’을 내려준 건 라디오였다. 이듬해인 중학교 1학년 겨울에 건강 프로그램에서 안과 의사의 강연을 듣고 간절한 마음에 방송국으로 편지를 보냈다. 여동생에게 대필을 시켜 쓴 편지엔 “제 눈을 고쳐달라”는 호소로 가득했다. 며칠 뒤 연락이 닿은 의사는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의사는 양씨에게 추천서를 써줬다. 서울맹학교에서 안마·침술 교육을 받도록 앞길을 터준 것이다. 부단한 노력 끝에 이후 양씨는 단국대 특수교육학과를 졸업했고 1990년 9월 꿈에 그리던 서울맹학교의 교사로 당당히 돌아왔다.
양씨는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은 장애인만 가르친다. 그의 수업에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이 있다. 양씨는 “후천적 장애인이 선천적 장애인보다 더 괴로워 한다. 현실을 부정하기 때문”이라며 “나도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위로를 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을 일상으로 복귀시키는데 주력한다고 했다. 양씨는 “때때로 학생들과 등산을 하며 꽃을 만지게 한다. 계속 용기내 과거를 회상해야 꽃이 무슨 색인지 잊지 않을 수 있다”며 “혹여 ‘검은 장미꽃’이라고 말하고 다니면 안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시각장애 1급 교사인 양회성(60)씨가 13일 서울맹학교 용산캠퍼스 한 교실에서 학생들과 전화통화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최지웅 기자
그런 양씨도 사상 첫 비대면 수업이 마냥 익숙하진 않다. 이럴 때일수록 35년간 교단을 지킨 ‘베테랑 교사’의 기지는 더욱 빛을 발한다. 이날 한 학생이 수업에 지각했다. 사연을 들어보니 휴대전화의 ‘비행기모드’가 켜진 줄도 모르고 30분간 발만 동동 굴렸다. 양씨는 대뜸 학생들의 격려를 유도했다. 그는 “출석 걱정마라. 다시 보충 강의하면 된다. 고생한 학생에게 박수!”라며 힘껏 양 손을 부딪혔다. 휴대전화 너머로 “괜찮아요” “고생하셨어요”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과 함께 박수 소리가 깔렸다. 양씨가 입가에 미소가 묻어났다.
정년 퇴직을 2년 앞둔 양씨의 목표는 시각장애인의 권리 증진이다. 양씨는 “퇴직 후에도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안마 기술을 더 연구해 내가 받은 행복을 되돌려줄 것”이라고 했다.
정년 퇴직을 2년 앞둔 양씨의 목표는 시각장애인의 권리 증진이다. 양씨는 “퇴직 후에도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안마 기술을 더 연구해 내가 받은 행복을 되돌려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