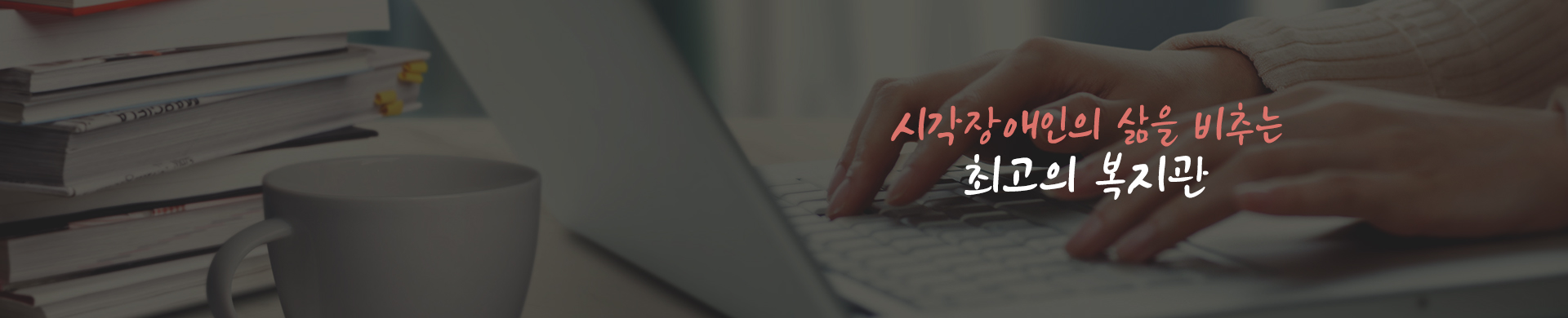시각장애인 화가가 그림에 심은 빛과 기억
화면이 반짝인다. 캔버스 안에 채워진 번뜩이는 은색 큐빅이 빛을 내뿜는다. 큐빅 수십 개가 하나의 형태를 만들어낸다. 그림 속에 나타난 형상은 그릇이다.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빛의 분위기가 오묘하다. 은색 빛을 드러내며 서너 개씩 포개지거나 혼자 덩그러니 놓여 있는 형상이 시선을 끌어당긴다.
이 작품은 지난달 28일부터 창원 마산합포구 브라운핸즈 마산점 맛산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기억 닮기-담다 그리고 닮다'전에 나온 박미(42) 작가의 근작이다. 남해 태생인 작가가 이번 개인전에 들고 온 모든 작품 속엔 큐빅이 모습을 드러낸다. 반짝이는 은빛 큐빅을 재료로 삼아 하나하나 꾹꾹 눌러 캔버스 안에 그릇을 빚어냈다. 조각난 기억이 그릇에 담겨 있고 겹쳐진 그릇이 소통하는 과정과 닮아있다고 판단한 작가가 보석처럼 빛나는 소재로 함께 소통하자는 바람을 표현한 작품이다. 이런 뜻이 담긴 작품 40여 점이 전시장에 나왔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내걸린 작품이 벽면 곳곳에 자리한다.
박 작가는 시각장애인이다. 그래서 촉감을 느낄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 작업을 완성한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빛과 촉감이다. 두 가지를 중첩해서 화면 안에 표현한다. 때로는 점자 형태를 작품에 나타내기도 한다. 이번에 작가가 내놓은 작업에도 점자가 등장한다. 촉감적인 소재를 사용하는 그의 작업 특성이 반영된 결과물인데, 점자로 건강, 사랑, 복과 같은 단어들이 화면 속 그릇에 표기됐다. 전시를 보는 누군가를 응원하는 마음이 작품 안에 담겼다.
이번 전시는 박 작가의 20번째 개인전이다. 그는 지난 2013년부터 기억을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주제 역시 주제가 기억이다. 눈으로만 작품을 만지고 손으로는 들여다보자는 게 전시의 큰 줄기다.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이 작품을 통해 좋은 기억을 떠올리고 갔으면 좋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기획이다.
박 작가는 "전시 이름이 기억 닮기-담다 그리고 닮다다. 기억 닮기는 단순하게 기억하기로 읽어도 되겠고, 기억한 것을 옮겨 그린 (아니면 기억 자체를 주제화한) 경우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며 "비워져 있으면서도 채워지고, 채워지면 비워지는 공간이 그릇이라고 생각한다. 서로 만남의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게 그릇인데, 그릇에 담긴 기억 속 가장 보석처럼 빛났던 순간이 언제인지 떠올려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빛과 촉감을 중첩해서 작업하고 보석처럼 빛나는 찬란한 주체로 소통하고 싶어서 큐빅으로 제작한 작품을 이번 개인전에 가져왔다. 촉감적인 작업을 해서 전시 성향에 따라 만질 수도 있겠지만, 손이 아닌 눈으로만 남기고 가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31일까지.